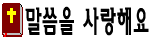문화&가정
문화,가정
삶 삶과 죽음, 그 사이의 21그램
연대기를 벗어난 복잡한 시제 구성을 가진 이 영화는 매우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나중에야 무릎을 치게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요즘 트렌드라 하더라도, 관객들이 이해할 때까지 자학하게 만드는 매우 나쁜(!) 편집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올 가을 꽉 쥔 주먹을 잠시 펴 보게 할 만한 참 좋은 영화로 감히 추천하고 싶다.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창조 이래 모든 인생의 관심사요,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인생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은 영혼. 영혼의 在와 不在다. 영화의 줄거리:
종교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잭(베네치오 델 토로). 그러나 그의 과거는 목에 새겨진 문신만큼이나 끈질겨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결국 그는 삶을 포기하지만 죽음마저 순순히 그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심장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폴(숀 펜). 그의 아내 메리(샬롯 겐스부르)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또 다른 삶을 이어 가고자 한다. 그러던 중 폴이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약물 의존증이었으나, 좋은 남편과 사랑스런 두 딸에게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 가던 크리스티나(나오미 와츠).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순간.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내듯 여러 모습으로 삶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아이를 가짐으로, 또는 남의 심장을 이식받음으로, 종교에 귀의함으로….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또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아름답게 빛나기도 하고 추하게 사그라들기도 하는 우리의 삶은 이 영화에서 보듯 죽음 앞에서는 삶,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죽음으로도 죽음은 갚을 수 없다. 삶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나 삶은 벗어나고 싶은 가장 고통스러운 굴레다.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죽음. 그것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고, 한번 벗어나면 돌아올 수 없다. 죄로 오염되었으나, 그래도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빛나는 선물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한 죽음 역시 가장 감사한 선물이다. 죽을 수 없다면, 우리의 삶 역시 의미가 없지 않겠나.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한다면 말이다.
영화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잭은 자신의 과거를 탈색하기 위해 신앙 생활을 시작한다. 종교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애착을 키워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이 거듭나지 않은 그는 결국 고통 앞에서 옛사람의 본성을 좇게 된다. 기독교 중독-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습관,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 남을 정죄하기 위해 쳐드는 손가락. 마음 아픈 일이다. 종교는 인간이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끄나풀이요, 자신의 본성이 만들어낸 지푸라기 같은 우상이니….
폴의 아내 메리는 아이에게서,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가족에게서 삶의 그림자를 찾는다.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이 주는 포만감이란 참 행복한 것이다. 어떤 때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 이들을 보면,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만한 존재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결국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 마음대로 곁에 둘 수 없는 것이 사람이요,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버리기도 한다. 방법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 위의 예수를 보아 알 수 있지 않겠나.
영화의 마지막 멘트는 이러하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21그램이 줄어든다고 한다. 누구나 예외 없이…. 21그램은 얼마만큼일까? 21그램…. 5센트 5개의 무게, 벌새의 무게, 초코바 하나.” 우리 영혼의 무게, 삶과 죽음 사이의 간격은 동전 다섯 개의 무게밖에 안된다. 죽음 후의 그날을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 이것보다 더 허무한 게 또 있을까.
연대기를 벗어난 복잡한 시제 구성을 가진 이 영화는 매우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나중에야 무릎을 치게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요즘 트렌드라 하더라도, 관객들이 이해할 때까지 자학하게 만드는 매우 나쁜(!) 편집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올 가을 꽉 쥔 주먹을 잠시 펴 보게 할 만한 참 좋은 영화로 감히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