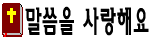칼럼
칼럼
글 수 387
더 늦기 전에
요즘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생명 경시’의 어지러운 흐름을 지켜보며, 마치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열차에 탄 것 같은 아득함으로 끝 모를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다. “잘 살아보세”를 되뇌며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내달린 끝에 돈을 모으는 데는 그럭저럭 성공했으나, 바르게 사는 법을 거의 배우지 못한 탓에 교회 안팎을 가릴 것 없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벌써 몇 년 전 통계지만, 미국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인터넷과 영상물을 통해 만나는 전쟁·폭력과 잔혹한 살인 장면은 줄잡아 5만 번 정도라 한다. 음란물을 접하는 횟수 역시 상당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아 보인다. 사이버 공간 속의 폭력적 영웅(?)을 무작정 모방하는 동조의식이 강화될수록 이른 바 ‘탈감각화’(desensitization) 현상이 심화되어, ‘나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폭력에 별 충격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를 쉴새없이 넘나들며 음란과 잔혹한 폭력에 익숙해져 현실을 꿈꾸듯 사는 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말해 봤자 도무지 씨알이 먹히지 않을 것은 뻔하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지닌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반사기능’(reflected function)이 있다. 갓난아이 앞에서 어른이 웃어주면 아이도 깔깔대며 웃고, 반대로 어른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아이도 덩달아 울먹이다가 마침내 와락 울어버리는 기능, 곧 상대방의 감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행동하는 복된 기능이 그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잘 유지되거나 자라지 못하고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린다.
핵가족화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가정에서조차 개인주의가 판치면서, 사회성의 1차 훈련기관인 가정의 기능이 심히 축소된 것도 문제고, 윤리 기준이 끊임없이 상대화되며 낮아지는 사이, 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이 깨지는 소리가 곳곳에 요란한 것도 문제다. 길거리로 매몰차게 내몰리는 아이들을 감싸안을 사회적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것 또한 작은 문제는 아니다.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다르다.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정부 기관의 한심한 명칭에서 보듯이, 돈 귀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느라 사람조차 ‘생명’이 아닌 ‘자원’의 일부로 보는 사회, “왜 맞고 다녀? 바보 얼간이같이”를 연발하며 ‘경쟁력’이라는 그럴듯한 구호 아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금쪽같은 내 새끼’만 잘 살게 만들려는 썩은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 “바르게 살자”는 말이 끝내 공허하게만 들리는 사회는 이미 망한 것이나 진배없다. 어디 로마제국이 힘이 없고 경쟁력이 없어서 망했는가.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기준임을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순결한 결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고질적인 학벌주의를 뿌리뽑고, 실용주의 교육정책을 생명중시의 정신으로 다듬어야 한다. ‘일’ 중심의 문화를 ‘사람’ 중심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모두가 잘 사는 길임을 알아야만 한다. ‘이김과 정복의 추한 경쟁력’을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경쟁력’으로 바꿔야 한다. 이 일에, 역사의 마지막 희망인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쓸만한 개척교회 하나(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같은 죄악의 땅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일어서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끼 날이 우리의 발등을 기어이 찍기 전에, “바보, 얼간이” 소리를 듣더라도, 추락하는 우리 사회의 열차에 거룩한 소망의 날개를 교회가 앞장서서 달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광우 목사 / 기독신문
Tweet
요즘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생명 경시’의 어지러운 흐름을 지켜보며, 마치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열차에 탄 것 같은 아득함으로 끝 모를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다. “잘 살아보세”를 되뇌며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내달린 끝에 돈을 모으는 데는 그럭저럭 성공했으나, 바르게 사는 법을 거의 배우지 못한 탓에 교회 안팎을 가릴 것 없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벌써 몇 년 전 통계지만, 미국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인터넷과 영상물을 통해 만나는 전쟁·폭력과 잔혹한 살인 장면은 줄잡아 5만 번 정도라 한다. 음란물을 접하는 횟수 역시 상당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아 보인다. 사이버 공간 속의 폭력적 영웅(?)을 무작정 모방하는 동조의식이 강화될수록 이른 바 ‘탈감각화’(desensitization) 현상이 심화되어, ‘나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폭력에 별 충격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를 쉴새없이 넘나들며 음란과 잔혹한 폭력에 익숙해져 현실을 꿈꾸듯 사는 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말해 봤자 도무지 씨알이 먹히지 않을 것은 뻔하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지닌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반사기능’(reflected function)이 있다. 갓난아이 앞에서 어른이 웃어주면 아이도 깔깔대며 웃고, 반대로 어른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아이도 덩달아 울먹이다가 마침내 와락 울어버리는 기능, 곧 상대방의 감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행동하는 복된 기능이 그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잘 유지되거나 자라지 못하고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린다.
핵가족화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가정에서조차 개인주의가 판치면서, 사회성의 1차 훈련기관인 가정의 기능이 심히 축소된 것도 문제고, 윤리 기준이 끊임없이 상대화되며 낮아지는 사이, 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이 깨지는 소리가 곳곳에 요란한 것도 문제다. 길거리로 매몰차게 내몰리는 아이들을 감싸안을 사회적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것 또한 작은 문제는 아니다.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다르다.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정부 기관의 한심한 명칭에서 보듯이, 돈 귀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느라 사람조차 ‘생명’이 아닌 ‘자원’의 일부로 보는 사회, “왜 맞고 다녀? 바보 얼간이같이”를 연발하며 ‘경쟁력’이라는 그럴듯한 구호 아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금쪽같은 내 새끼’만 잘 살게 만들려는 썩은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 “바르게 살자”는 말이 끝내 공허하게만 들리는 사회는 이미 망한 것이나 진배없다. 어디 로마제국이 힘이 없고 경쟁력이 없어서 망했는가.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기준임을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순결한 결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고질적인 학벌주의를 뿌리뽑고, 실용주의 교육정책을 생명중시의 정신으로 다듬어야 한다. ‘일’ 중심의 문화를 ‘사람’ 중심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모두가 잘 사는 길임을 알아야만 한다. ‘이김과 정복의 추한 경쟁력’을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경쟁력’으로 바꿔야 한다. 이 일에, 역사의 마지막 희망인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쓸만한 개척교회 하나(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같은 죄악의 땅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일어서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끼 날이 우리의 발등을 기어이 찍기 전에, “바보, 얼간이” 소리를 듣더라도, 추락하는 우리 사회의 열차에 거룩한 소망의 날개를 교회가 앞장서서 달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광우 목사 / 기독신문